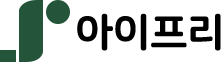독서칼럼
[2025 힐링하는 글쓰기] 안시아 교육생 수필: 정답 없는 선택
조회수 26 작성자 아이**02 등록일 2025-09-15 좋아요 0
도서명2025 힐링하는 글쓰기 작품집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저자백선순, 신나라, 심연숙, 안시아, 엄다솜, 정은교, 정명섭
출판사실로암점자도서관
[수필] 파란만장 유년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참 파란만장했다. 엄마는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입덧이 심하셔서 10개월 내내 입덧으로 고생하셨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엄마의 배를 보고 동네 아주머니께서 다들 물어보셨다.
“배가 많이 나왔네? 한 5개월 됐어? 새댁?”
“아니요. 내일 출산하러 병원 가요.”
“어머, 배가 전혀 만삭 임산부가 아니야. 아무튼 출산 잘하고 와.”
“네.”
그렇게 엄마는 나를 낳으러 병원으로 가셨고 무사히 제왕절개로 3.4킬로의 딸을 낳았다. 아빠는 엄청 기뻐하셨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딸 낳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라고 할 정도였다. 우리 친가에는 아빠를 포함하여 4형제였고 사촌들도 남자 형제가 다 많았기 때문에 아빠는 딸을 원했었다. 그런 아빠에게 귀하고 금쪽같은 딸이 태어났으니 행복해했을 아빠였다.(커서도 나한테는 유일하게 장난을 잘 치곤 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였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에게 내가 갑작스럽게 인큐베이터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 아빠에게 찾아왔고 하지만 의사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아버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왜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말이 돼?”
귀한 딸이 태어나자마자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는데 의사라는 사람은 싸가지 없게 말을 하니 아빠는 화가나 의사를 죽지 않게 두들겨 팼다. 엄마는 나중에 회복실에서 나온 뒤에 아빠에게 전달받았다. 그렇게 무사히 병원 생활을 마치고 엄마와 나는 병원에서 돌아왔다.
아빠는 카메라를 사 오셔서 나와 엄마를 찍으셨고 양가 친척들에게 예쁨을 받았다. 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를 인정하셨다. 그리고 아빠는 돈을 벌어 오시면 예쁜 장난감을 사오시고 나는 그걸 잘 가지고 놀았다. 귀에 귀걸이도 걸려있었고 이쁜 공주 옷도 입었다.(나중에 들은 바로는 동생이 내 장난감을 다 부숴 버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겐 큰 슬픔이 몰려왔다. 아빠가 퇴근하고 나를 보러 방으로 들어왔을 때였다.
“여보, 애가 나랑 눈을 안 마주쳐. 웃지도 않아.”
“잠시만.”
아빠는 라이터를 꺼내서 내가 불빛을 따라오는지 확인하셨고 따라오지 못하는 걸 확인하셨고 잘 웃지도 않는 걸 알자 그때부터 여기저기 좋다는 병원을 다 다니셨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큰 병원이 없었기도 했다. 그때 아빠도 계속 사고도 나고 해서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무당집으로 나를 등에 업고 무당집으로 향하였다. 무당집으로 들어가자 앉기도 전에 무당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는 왜 와. 아이구 답답해.”
“무슨 말이세요?”
“속세의 인연이 아닌데 결혼을 했어 너가.”
“네?”
“전 남편하고 아이가 아파서 왔는데요?”
“아이구 답답해. 그 집은 터가 아니야 너네한테.”
“거기 있으면 너희가 계속 다쳐. 서울로 가.”
“네 감사합니다. 복비는?”
“그냥 가.”
그 후 우리는 무당의 말대로 구미에서 신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와서 동네 종합 병원으로 가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까지 가게 되었고, 그 병원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병원 교수님께서도 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진 못하셨고 다른 말씀만 전하셨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이를 병원에 두고 가세요.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게요. 두고 가시겠어요?”
“아니요,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게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나와 그 뒤로 또 다른 병원을 전전하게 되었다. 신월동에서 금천구 시흥동 한 지하방에서 살면서 나와 내 동생은 유치원을 같이 다니게 되었다 그때 나는 6살 동생은 4살이었을 때다. 내가 혼자 다닐 수가 없어 엄마는 동생을 같이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엄마는 지하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39킬로까지 마르기 시작했다.
유치원 때부터 엄마는 내가 사람 구실이라도 하게 하려고 나를 혹독하게 가르쳤다. 그 바람에 동네에선 엄마가 계모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 동네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너희 엄마 계모냐고 물어봤다.
“얘 민아야, 너희 엄마 계모 아니니?”
“아닌데요. 친엄마 맞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너희한테 못되게 굴어.”
내가 왼손잡이인 터라 연필은 오른손잡이로 잡으라고 왼손으로 연필 잡을 때마다 때리셨다. 내가 고집부리면 속옷만 입히고 내보내셨다. 그게 매일 반복적이었고 나도 오기가 생겼는지 반항인 건지 왼손잡이로 글씨를 쓰다가 엄마랑 대판 싸우고 쫓겨났다. 무슨 고집으로 나도 지지 않고 안 들어갔다. 아빠가 퇴근할 때 돼서야 집에 들어갔다. 그게 반복이 되니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됐다.
또 한번은 내가 손힘이 약해 우유팩을 못 따서 엄마나 동생이 따주고 아빠가 해줘 버릇하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엄마는 내가 손에 힘을 기르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동생에게 나한테 도와주면 같이 혼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해 버릇해. 보연이 너 언니 우유팩 열어주면 혼나!”
“알았어.”
혼자 낑낑거리고 있으니 동생이 엄마 몰래 와서 열어준 적이 있다. 그리고 또 심부름은 내 차지였다. 동생은 집에서 거의 상전이였고 나는 심부름은 혼자 다 했다. 그래서 한번은 울면서 엄마한테 대든 적이 있다.
“왜 쟤는 안 시켜? 왜 나만 시켜?”
이렇게 울어도 봤지만 소용없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내가 손힘이 약해 돈을 들고 오다 보면 손에 남는 건 얼마 없었다고 한다.(근데 지금도 돈을 손에 쥐고 있음 잃어버리긴 한다.)
“그치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때로는 동생도 시켰어야 돼.”라고 난 지금 엄마에게 말하고는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나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 같다. 혼자 잘할 수 있게, 할 줄 모르는 아이보다는 뭐든 잘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거 같다.
나도 만약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늘 해주는 대로 컸었더라면 집에서 날 왜 낳았냐며 엄마 아빠 원망만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에 노력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부모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란 걸 내 스스로 알기에 단 한 번도 원망해 본적도 없다. 그저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곤 한다.
* 해당 글은 2025년 실로암점자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힐링하는 글쓰기'의 교육생이 작성한 글입니다.